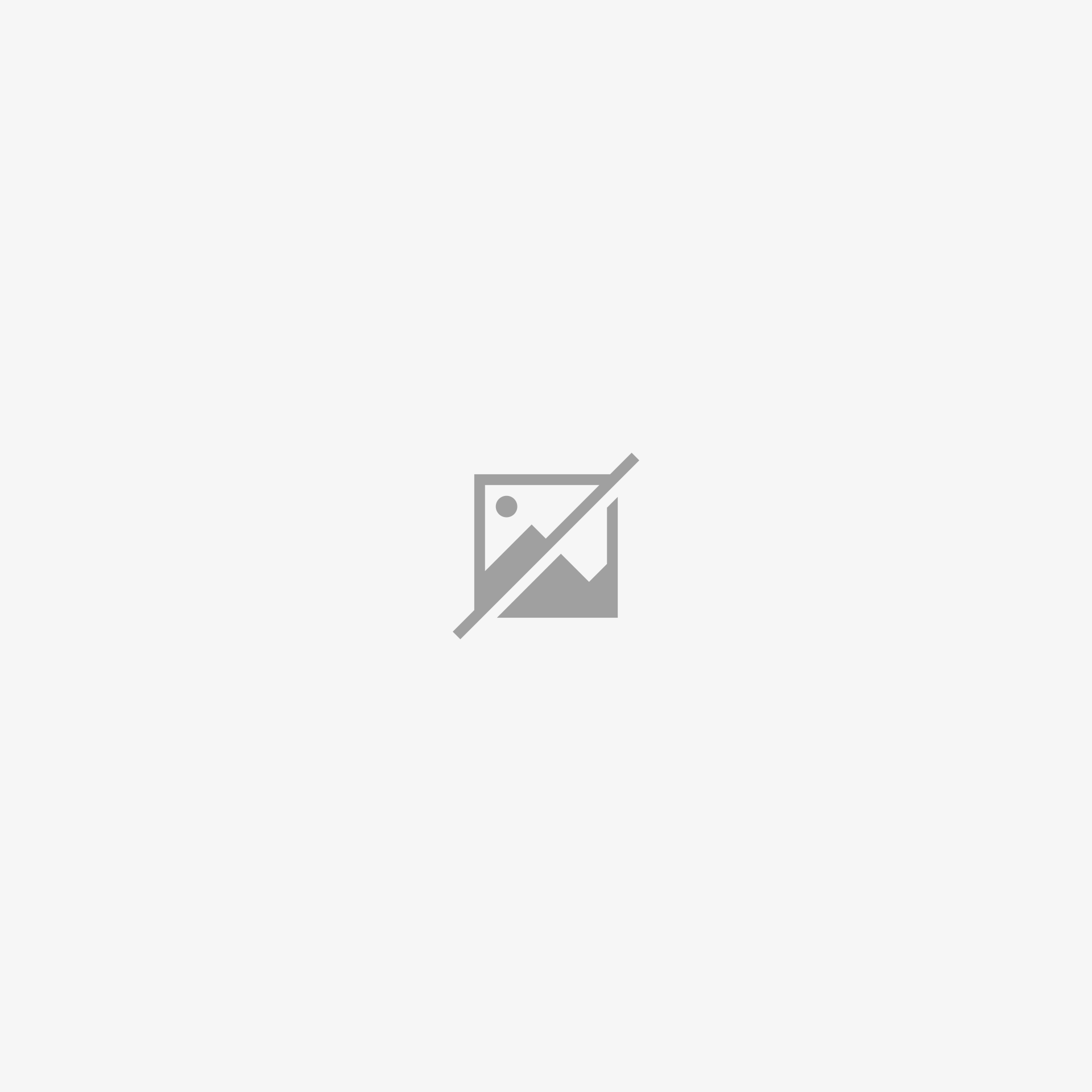2025.10.17
믿을 수 없이 바쁜 몇달이 갔다. 밀도 높은 이 시간의 조각을 간직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적어보고 싶어졌다.
엄마가 말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리고 불안정한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술하는 자아를 지키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동시에 결혼을 준비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 졸업심사를 거쳤고
AI 기술에 관한 전시에서 강아지들의 걸음으로부터 출발한 퍼포먼스 그림자 산책을 참여자 분들과 함께 퍼폼했다.
지난 몇달의 매일을 상세히 기록했다면 좋았을 텐데 일과를 마치고 집에와서 바쁘게 잠을 청하는게 우선이라
소중한 기억들, 때론 강렬하고 냄새나는 기억들이 많이 휘발되어 아쉽다. 그럼에도 기록하자면
퍼포먼스는 우연과 즉흥을 모두 껴안는 일이라 했는데, 나는 내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만드는
온통 우연과 즉흥인 그 시간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라 붙는 다는 것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퍼포먼스 참여자 모집을 공지하고, 참여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함께 걷는 당일 참여자를 기다리는 시간의 1분 1초가 모두 긴장과 불안이었다. 나의 불안을 똟고 어느새 나타난
함께 한 모든 얼굴들이 떠오른다. 가족의 도움도 있었다. 멀리서 병원을 가려고 온 부모님이
처음으로 작업에 참여했고 중년의 아주머니들, 아저씨도 참여했다. 짝꿍도 함께 했다.
퍼포먼스가 끝나고 처음만난 이들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어서 참 따뜻했다. 흔쾌히 함께 이 일을 준비해준 동료에게도 고마왔다.
소리와 걸음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렵게 함께 걷는것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되었다는 말도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소중한 응답이었다. 작업을 하며 누군갈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닿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부름과 동시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았다.
졸업심사를 봤고, 통과했다. 드디어 졸업한다!
2018년에 어떻게 학교를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미술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게 미술인지 무엇인지도 모른채 입시 원서를 넣었는데
뭔갈 만들고 위로하고 유희하는 내 마음을 알아 본 선생님 덕에 미술을 알 수 있었고 아직도 알아가고 있다.
학부에서 미술을 하지 않았기에 미술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호와 상징과 역사와 작업의 작동원리를 작업에서 드러내는 것에
꽤나 많은 애를 먹었다. 그렇지만 동료에게 배우고, 미술관에서 배우고, 때론 길에서 때론 집에서 그냥 아직도 계속 배운다.
나한테 뭘 만들고 보여주는 일은 아직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것 말고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 수 없다.
2025.02.27
엄마집에 갈 때마다. 기억이 사라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밥을 먹으며 들어 그런지 내 몸 어딘가를 돌아다니며 오랜시간 나의 구석구석을
후비고나서야 겨우 잊혀질까 말까한다.
기억이 사라지는 노인들은 같은 말을 몇번이고 반복하는데, 모든것을 잊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의 일은 그들의 반복되는 말을 차근히 듣고 그래서 진정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내는 것이라 했다.
어떤 이들은 선명한 기억과 인지보다 서둘러 나이들어버린 몸에 살기도 한다고 했다.
하고싶은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몸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수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알고, 겪는 세계가 궁금해진다.
언젠가 내가 더 이상 무언갈 기억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내 몸에 남는 말은 무엇일까?
내가 더 이상 계단을 두어개씩 훌쩍 뛰어 넘을 수 없을 때 내 세상은 무엇이 될까.
기억은 몸에 남은 것일까?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줄어들면 기억도 줄어드는 것일까.
2024..09. 30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봄이 오고 여름이 간다 어쨌든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다. 그리고 겨울이 온다.
생의 주기를 걸쳐 늘 경험했던 여러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내 잊혀지고 나는 지금의 감각만을 생생히 느낀다.
추운 겨울에 여름의 감각은 너무나 둔하고 아스팔트가 녹을만큼 뜨거웠던 여름에 짚어보는 겨울 또한 아득하기만 하다.
나는 나의 감각을 토대로 세상을 인지하고 세계를 구축한다.
견고해 보이는 나의 세계는 겨울에 떠올리는 한여름만큼이나 희미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다.
희미한 몸이 기억한 세계는 종종 어긋나고 실패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실패한 말들이 있다. 가 닿기를 염원하다 사라지는 말들도 있으며
출발했어도 도달하지 못한 말들도 있다.
언어화 되지 않는 실패의 기록들을, 말이 되지 못한 흐릿한 기억들을, 이 실패의 기록을 모아 다시 견고하게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자 한다.
2024.. 08. 25
며칠 전 산책길에 연두색 감을 주웠다. 초록색 반점이 사랑스럽다.
감이 익고 떨어지는 걸 보니 여름이 가고 천천히 가을이 오려나보다.